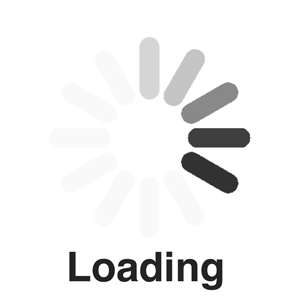- 홈
- 소개
- 뉴스
소개
뉴스
| [기고] 노벨상과 철학박사 그리고 공학전문대학원 |
|---|
|
|
철학박사와 과학석사공학박사에 해당하는 영어 표기는 Ph.D. (Doctor of Philosophy)인데, 아무리 들여다 봐도 공학박사가 아니라 철학박사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학석사도 마찬가지인데, 영문 졸업장을 발급받아 보면 Master of Science라고 적혀 있다. 공학석사가 아니라 사실 과학석사다.
여기서 유추 할 수 있는 것은 공학이 과학에서 파생되었겠구나 하는 것이다. 공학석사를 좀 더 길게 풀어 쓰면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이다. 공학도 그렇지만 과학이라는 말도 쓰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원래는 자연철학이었다. 자연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아이작 뉴턴이 F=ma를 소개한 책의 제목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이다. 몇가지 간단 명료한 수학 법칙으로부터 시작하여,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4개 달들의 움직임을 수학으로 예측하고 망원경 실측값과 비교하는 것으로 끝맺는데, 책이 출판된 1687년 이후 3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없이 이공계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이고 아인쉬타인을 비롯한 노벨상 수상자들도 다 이렇게 배우고 연구했다.
굵직한 자연의 법칙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알아내는 것을 넘어 활용하려고 하게 되고 공학이라는 분야와 이름도 탄생했다.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인공’적인 세상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공학박사와 공학석사라고 읽지만, 각각 (자연)철학박사와 과학석사라고 쓰여 있는 근본 이유이다.
과학과 공학과학이라는 것이 몰랐던 것의 발견 자체, 즉 앎의 확장 자체가 목적이라, 즉시적 유용함과 활용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Master of Science와 Doctor of Philosophy가 이론에 가치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이름에서부터 그 근본 속성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설계하고 만든 인공물들이 대량생산과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업이 되고, 성장이 있는 곳이 의례 그러하듯 곳곳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발견이라고 하는 과학의 의의보다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춤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었다. 현실에 있는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이를 해결하는 훈련이 된 전문가들 말이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Master of Engineering, Doctor of Engineering 이다. 길가는 사람에게 한국말로 번역해 달라고 하면 열에 아홉은 공학석사와 공학박사라고 번역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공학석사, 공학박사라고 하면 M.S.와 Ph.D.가 아니라 M.E.와 D.Eng라고 쓴다. Ph.D.라고 하면 학위를 미국에서 하였구나 생각한다.
일본 노벨상 수상자중 공학박사 대부분은 자국에서 학위를 받은 M.E.와 D.Eng. 이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여덟 분이다. 청색 다이오드로 유명한 나카무라 슈지 교수도 M.E. 학위를 가지고 니치아화학를 다니며 형광물질을 연구 개발과 생산을 직접하며 D.Eng. 학위를 취득했다.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논문으로 D.Eng.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과 영연방에는 유수한 학술지에 5편 정도의 논문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과하면 박사학위를 주는 논문 박사제도가 있다.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도 캠브리지에서 논문 박사를 받았다.
전세계를 상대로 첨단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현업 분야에서는 그 자체가 참신성이고 혁신성이다.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은 ‘질화인듐갈륨 고휘도 청색LED에 대한 연구’로 실험장치까지 직접 용접해 만들며 실험해 양산까지 성공한 첨단 기술을 담고 있었다.
도미(渡美)해 UCSB로 자리를 옮긴 나카무리 슈지 교수의 일본에 대한 불만은 유명한데, 한국에 계셨다면, 직장을 다니며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도 못하셨을 것이고, 아마 아직 그 회사에 다니고 계셔야 했을 것이다.
가상의 문제 vs 현실의 문제아무래도 이론을 하게 되면, 실험 보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생각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원리를 알아내야 하므로, 끊임없이 적절한 가설, 적절한 문제를 찾고 정해야 한다. 이 문제 자체가 가상이라서, 그것을 정하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과학의 가진 속성이다. 보통의 이공계 대학원 생활의 절반에서 삼분의 이는 이 문제를 찾는데 보내게 된다. 그러니 표정이 밝을 수가 없다.
반면, 실전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가상의 문제를 찾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 현장은 문제가 지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객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평가자가 존재하게 되어 연구를 추진 시키고 마감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Master of Engineering 학위를 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 공학 학위 명명체계와의 호환을 위해 Master of Engineering를 공학전문석사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Master of Engineering을 공학석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하겠다. 엄밀히 말하자면,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은 공학전문과학석사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에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데, 학계는 정작 실전문제를 푸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불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들여다 보면 사실 이름부터 공학석사, 공학박사가 아니라 사실은 과학자와 철학자를 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ster of Engineering공학전문대학원의 공학전문석사 과정은 이미 입학할 때부터 현업 베테랑인 학생들이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 문제의 주인이 교수가 아니라 학생이다. 따라서 문제를 찾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한가지 분야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전공 자체를 넘어설 수 밖에 없게 된다. 내가 지도한 Master of Engineering 졸업생들은 전원이 본인 분야 최고 학술지에 논문 게재 하였거나 심사중에 있다. 보통의 석사 과정에서는 이런 실적은 일반적이지 않다.
공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의 한사람으로써, 수십명 연구원들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산업 현장의 실전 문제를 풀고 지도하였던 나는, 반도체,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바이오 산업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내 공학기반 제조산업의 현장을 속속들이 파악하게 되었다.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을 이해하고 머리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인정받은 엔지니어인 학생들과 토론하고 실험하고 하다 보면 알게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실제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풍부한 사례를 갖게 되니, 물리, 화학, 에너지, 전기, 기계, 컴퓨터, 환경, 건설, 경제, 경영, 정책 할 것 없이 그 이해의 깊이가 몇층 깊어졌음을 느끼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제 분야가 아닌데요’같은 말은 하지 않게 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UWZ-0lFNsc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김성우 교수 |